| [충청매일] 충북 근대 미술의 서막과 일본인 | |
|
[2025. 06. 11.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지역사읽기] ※ 오피니언 133번 게시글 내용과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충북의 공연예술과 관련된 기록을 정리해 보았다. 화제를 옮겨 충북의 근대미술사를 중심으로 한 전시 예술 부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공연 분야도 그랬지만, 근대 미술 역시 전통 미술과는 단절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런 성격은 용어에서부터 확인된다. 근대의 ‘미술’은 공간 및 시각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정의되고,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등을 망라한다. 이 중에서 조선시대에도 썼던 용어로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정도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양식 정의와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크다. ↓ 원문보기 클릭 |
|
| 기사원문 출처 |
충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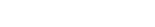
CRI 오피니언
CRI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