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선전’과 충북 미술인의 ‘창씨개명’ | |
|
[2025. 11. 05.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지역사읽기] ※ 오피니언 159번 게시글 내용과 이어집니다.
특히 안승각은 ‘미술 교육’으로 우리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주목된다. 물론, 안승각 이전에도 충북 지역에 정착해 제자들을 기르고, 선전에서 입선도 하고, 전시회도 연 미술 교사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모두 일본인이었다. 황해도 출신의 안승각은 한국인 최초로 우리 지역에 정착한 선전 출신 명망 화가이자 미술 교사로, 해방 후 일본인 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간 뒤 미술 교육의 불모지가 되다시피 한 이 지역을 지키며 세계적 화가의 반열에 오른 윤형근(1928∼2007) 같은 제자를 길러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안승각은 선전에서 모두 네 차례, 네 작품으로 입선했는데, 뒤의 1940년과 1942년의 두 입선작은 ‘안정 승일(安井承一)’이란 이름으로 출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덧붙이고자 한다. 일제는 황국신민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1939년 11월 10일, 조선 민사령(제령 19호)을 통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소위 ‘창씨개명’을 공포, 1940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명목상 자발적 신고제였지만, 관공서, 학교, 회사 등에서는 이 시책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강제적 성격을 띠었다. 1940년을 기점으로 안승각과 더불어, 선전 출품 시에 이름을 바꾼 이는 청주 출신의 송정훈[宋政勳 → 송정민(松井民)], 마지막 선전인 1944년에 초(初) 입선하고 해방 후 국전 추천·초대작가로 활동한 이기원[李基遠 → 신궁동식(新宮東植)] 등으로 확인된다. 본명과 개명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1940년(19회)부터 1944년(23회)까지 선전에서는 충북으로 주소지를 둔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만으로 국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러한 ‘창씨개명’ 유무와 선전 작품에서의 ‘친일 성향’, 나아가 작가의 친일 행적 유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개별 활동을 한 미술인과 달리 공직(교사를 포함)에 있었던 이들, 또 진학(유학) 등의 목적을 가진 이들은 불가피하게 또 편의에 따라 그 시책을 받아들인 측면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선전’에서도 ‘채관보국’(彩菅報國, 그림을 그려 국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1937.7.) 이듬해인 1938년 5월 치러진 17회 선전에서 ‘천인침(千人針)’ 그림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한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에는 이러한 요구와 압박의 정도가 한층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선전’의 도록, 관보,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충북 연고 미술인의 작품에는, 이러한 노골적인 ‘총후미술(銃後美術)’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계속).
↓ 원문보기 클릭 |
|
| 기사원문 출처 |
충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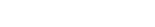
CRI 오피니언
CRI 이슈

